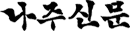길
- 입력 2010.03.22 10:23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덕룡산을 넘어 불회사에 소풍을 갔을 때 이 길을 지났다. 죽은 고목을 밟고 마을 돌길을 밟아 지나갔던 길이다.
운주사에도 소풍을 갔었다. 다도면 판촌리 시내를 건너고 자갈길을 지나서 화순군 도곡면 '천불천탑'에 갔었다. 전교생이 줄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맞추어 갔다. 선생님의 호르라기 소리에 발을 맞추고, 선생님께서 "번호 붙여가!"하시면 "하나, 둘, 셋, 넷!"을 반복하였다. 군가도 불렀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저녁 어두워질 때 별빛을 쳐다보며 달을 친구삼아 돌아오기도 했다.
좁은 길은 넓고 곧은 길로 바뀌었다. 자동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고 있다. 하얀 연기를 내면서 느리게 나는 비행기도 있고 제비처럼 "쌩!" 순식간에 날아가는 전투기도 있다. 바다에는 배가 다닌다. 화물선, 여객선, 어선들이 지나간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길, 즉 차도(車道)를 가고, 비행기는 비행기의 길, 즉 항공로(航空路)를 간다. 배는 배의 길, 즉 항로(航路)를 가고, 사람은 사람의 길, 즉 인도(人道)를 간다.
여름 저녁이면 월드컵운동장 보조경기장의 트랙을 걷는다. 여덟 개의 트랙을 각자 걷는다. 사람만 걷는다. 나의 길을 걷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걸어도 자기의 길을 걷는다. 남의 길을 넘거나 줄을 밟지 않는다.
개나 자동차는 걷지 않는다. 사람의 길이기 때문이다. 느린 사람 빠른 사람, 남자, 여자,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가 함께 걷는다. 모두 함께 걷는다. 우리의 길을 걷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는다. 역주행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 일찍 나온 사람은 일찍 돌아가고 늦게 나온 사람은 늦게 돌아간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걷는다.
한 번 지난 길을 잘못 걸었다고 출발점에 돌아와 다시 걸을 수는 없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는 아무 곳에도 길을 내지 않았다. 사람이 스스로 내어가도록 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간다. 정해 놓은 길,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간다. 사시사철 꽃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투덜투덜 자갈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길을 가고 악한 사람은 악한 길을 간다. 누가 만들어 주지 않았고, 누가 사키지도 않았다. 자기가 만들어 자기의 길을 간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야 자기다운 사람이다. 상인에게는 상도(商道)가, 신사에게 기사도(騎士道)가 있듯이 공직자는 공직자의 윤리(倫理)가 있고, 교육자는 사도(師道)가 있다. 세상 모든 일에도 길이 있다.
길에는 가야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가야할 길은 생명의 길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바른 길(正道)이요, 죽음의 길은 그릇된 길(邪道)이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길이 있듯이 민족에게도 길이 있었다. 중세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세 갈래가 있었다. 시베리아에는 초원의 길, 중앙아시아에 비단길, 인도양을 거치는 바다길이 있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고대국가가 붕괴되고 중세사회로 이행하였다. 십자군의 이동으로 중세사회에서 근대왕권국가가 태동되었다.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길을 잘 갔던 시기에는 흥하였고 고유의 길을 벗어날 때 쇠망의 길을 걸었다.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우리 민족도 민족의 길을 바로 걸을 때 융성하였으나, 말기에 샛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다.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우리민족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가도록 2세 교육이 바르게 서야 한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다. 나의 길은 나만의 길이었다. 나는 오솔길이나 돌아가는 길이 아름다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르는 길을 알아서 나보다 훨씬 앞서 나아갔다. 뒤따라오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만치 나아간다. 나를 아는 지인 몇 사람이 지름길을 가르쳐 주었다. 샛길도 가르쳐주었다. 나도 지도를 보고 연구도 해 보았다. 나도 그 길을 찾아 더 앞서 나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었다. 나답지 않은 길이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빙긋이 웃음이 나온다.
덕룡산을 돌고 돌아서 미륵사에 들렀다. 대웅전의 문을 살며시 열고 부처님께 인사를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만 짓는다. 저 멀리 말없이 묵직하게 앉아있는 무등산의 정기를 가슴 깊숙이 받아들인다. 저수지 제방을 따라서 걷는다. 한길을 넘어서 넓은 들판을 건너 학교로 돌아온다. 하늘을 찌르는 메타세쿼이아 숲속에 학교 건물이 있다. 체육관과 운동장도 그 사이에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천사가 되어 있다. 신선들이 사유하는 지상 낙원에 내가 들어섰다. 나도 신선이 되어 나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가야 할 길, 나만의 길을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련다.
(2009)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