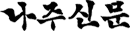청강 장봉화 선생의 수필
아버지의 소원(마지막)
- 입력 2010.05.18 18:11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무렵 형님이 결혼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 후 대성학교 근무하던 때 3월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의식이 돌아오고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고혈압입니다. 간도 좋지 않고 모든 장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나 형제들은 40을 못 넘겼는데 나는 오래 살았소. 퇴원하겠소."
그리하여 바로 고향집으로 돌아오셨다. 6개월 후에는 회복되어 부모님께서 광주의 내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셨다.
당시 나는 직장에 다니던 여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두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병이 다 나았다고 좋아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 가계가 고혈압인 줄도 몰랐다.
다음해 봄 다시 쓰러지셨다. 어머니께서 대소변을 받아내었다. 아버지는 방안에서 기어 다니셨다.
어머니와 형님 내외는 아버지만 남겨 놓고 들에 일을 하러 가기도 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묘자리는 우리 밭에 내가 표시해 두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다.
"내 묘에 비석을 하나 세워줄래?"
1972년 음력 10월 21일의 일이다. 우리 마을에서 학교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께서 운명하셨다는 것이다. 향년 63세를 기록하였다.
동생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차디찬 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듬고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울고 또 울었다. 8 남매가 함께 울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울었다. 큰 매형은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다.
입관할 때도 큰 소리로 울었다. 방에서 마당으로 운구할 때에도 서글피 울었다. 하관할 때에도 울었다. 나보다도 우리 형이 더 많이 울었다. 그 때의 우리 형제자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1978년 우리 형제는 고향 초가집을 허물고 새로 기와집을 지었다. 옛날 초가집 사진 한 장 남겨놓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고향을 지키는 우리 형님은 수년간 마을 이장을 하였다.
2006년에는 다도면 송학리에 우리 할아버지를 중시조로 하는 문중의 선산을 마련하였다. 할아버지 내외분을 비롯한 아버지 형제와 내외분 모두를 선산으로 모셨다.
제단, 상석과 비석도 세웠다.
2008년에는 형님이 고향집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의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해도 나는 한없는 아쉬움과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건강하실 때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했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시켜드리지 못하였고, 맛있는 것을 사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기와집과 비석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뿐이다.
(2009)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