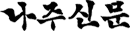우리 어머니- 1
청강 장봉화
- 입력 2010.05.24 14:16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전 어머니께서 95세를 일기로 저 세상으로 가셨다. 떠나시던 바로 그날 네 시간 전에 증손녀를 새 가족으로 데려다 놓으셨다. 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의 전 과정을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되새겨 보았다.
어머니는 1919년 12월 17일 봉황면 옥산리 인읍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외가는 파평 윤씨로서 나주시 남평면과 산포면에 친척이 계신다. 외할아버지는 산포면 솔안마을에서 언덕 너머 봉황면 인읍마을에 이주하여 살았다.
외할머니는 주씨 집안에 시집을 갔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외할아버지에게 개가하였다. 그래서 낳은 딸이 어머니였다. 배가 같은 오빠 한 분을 제외하면 무남독녀였던 셈이다. 외할아버지는 족보에 양손(養孫)을 하나 들였다.
어머니는 스무 살 때 우리 마을에서 스물세 살이던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다. 외할아버지께서 착실하다고 아버지를 사위를 삼으셨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산포면 솔안 마을 앞에 논을 약 1,600평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 그 중에서 절반은 양손에게 주고, 4분의 1을 주씨인 외삼촌에게 주고, 또 4분의 1은 어머니에게 나누어주셨다.
그런데 양손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상속받은 논 중에서 절반을 팔려고 하자 어머니가 그 땅을 사셨다. 길쌈을 하여 모은 돈으로 사셨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곤 하였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못하였지만 사람 사는 도리에는 밝으셨다. 특히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많이 베푸셨다.
우리 이웃집에 송씨라는 분이 있었다. 사람들은 대개 그를‘상매양반’이라고 불렀다. 상매양반은 아버지와 벗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마누라나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살았다. 마을 입구 산 아래 200평 정도 되는 논을 벌었다. 천수답이라 수확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농사일을 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다.
상매양반은 게나 꼬막,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지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였다. 며칠 만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큰 조개를 하나씩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겨울에 아침상을 받고 있으면 아저씨가 콧물을 흘리면서 불쑥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국 한 그릇에다 우리가 먹는 밥을 덜어주어 같이 먹도록 하였다.
"동촌 양반, 유치사돈! 막걸리 한 잔 잡수고 가시오."
모내기와 논매기를 할 때면 어머니는 막걸리를 담가 놓고 집 앞의 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불렀다. 여름에는 보리술이요, 겨울에는 쌀 술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친구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도록 이르셨다. 그래서 나는 어쩌다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올 때는 그 흔적을 감추고 어머니께 들키지 않도록 했다.
내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 그러나 공부하라고 달달 볶지는 않았다.
"나 급장 할랍내다."
혹시 선생님께서 물으시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셨다. 학교교육을 받지는 못했어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성취동기를 심어줄 줄 아셨던 것 같다. 내가 중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나를 학생복에다 모자를 씌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다. 우리 8남매 중에서 중학교에 보내는 것은 다섯째인 내가 처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집에는 딸들이 많아 어머니는 일찍부터 부엌일을 시키셨다. 노작교육을 철저히 하신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들일도 많이 하셨다. 힘든 두레질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어머니가 60세 되던 해 197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년 동안 삭망을 쇠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밥상을 차려 놓고 곡을 하였다. 그리곤 늘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 말씀하셨다. 탈상을 지낸 후부터 안정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다. 마침 조카딸 희선이가 태어나서 말벗이 되었다.
"너희 아버지 약이다."
고깃국을 끓여서 아버지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고기 못 먹는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참말로 그런 줄 알았다.
"나는 먹었다. 나는 배 안 고프다."
밥이 부족할 때 하시던 말씀이다. 나는 참말로 그런 줄 알았다.
어머니는 자식 생일이나 명절에는 꼭 목욕을 하신 후에 상을 차려 놓고 소원을 빌었다. 마을 여인들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곤 하였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생일에,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 다음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가난하였지만 나눔으로써 인심을 얻었다. 동네 사람들은 부잣집의 초대에는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우리 집의 초대에는 많이 모였다.
인부를 동원하여 조부모님, 백부모님, 중부모님의 시신을 선산에 모셨고, 그분들의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지내드렸다. 제삿날이면 오촌 고모, 나의 사촌과 나의 누나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다. 혼령도 이러한 정성에 감동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1984년에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떴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도 묻지 않으셨다. 대학 3학년 때 병이 나서 8년간 투병하던 막내 동생이 1986년에 저 세상으로 갔다. 8년 동안 어머니의 관심은 오로지 막내아들이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고! 화장하여 강에 흘려보낸 후에야 안정을 찾으셨다.
15년 투병 중이던 큰 누님이 2006년 여름 어머니보다 1년 빨리 저 세상으로 갔다.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묻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큰 아들 슬하 두 손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흔 살이 될 때까지 광주의 아파트에서 손자들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 주셨다. 그리고 아흔 살이 되던 2002년 추석에 고향의 큰 아들한테 가서 광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