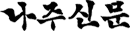나종삼 옹의
옛날 나주이야②
- 입력 2011.12.15 20:46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에는 오장군이 있었고 영암에는 학성군이라는 장군 즉 장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주의 오장군은 항시 영암의 학성군과 한번 힘을 겨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마침 영암에 학성군이 짐대를 세워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짐대란 나무나 돌로 탑이나 당간 같이 높게 세운 대인데, 고을을 상징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주의 오장군이 "느그 영암 같은 고을이, 무슨 놈의 짐대를 세워야? 나주도 없는디."
하고는 가서 그 놈을 딱 떼어서 짊어지고 나주에 갖다 세워놓았다. 짐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학성군이 가만히 염탐을 해보니 "누가 짊어지고 저, 나주로 가더라."고 했다.
학성군이 나주에 와보니 짐대가 떡하니 서있는 것이 보였다. 학성군은 화가 나서 밤에 그것을 빼서 짊어지고 다시 영암으로 가져가 세워놓았다.
두 장군은 이런 일을 번갈아 계속하여 짐대는 영암에서 나주로 다시 영암으로 오가기를 반복했다. 하루는 오장군이 생각하기를,
'요 놈을 꾀로 써가꼬 요 놈을 못빼겄게, 못가져가겄게 맨들어야 쓰겄다'
하고는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리고는 영암에서 짐대를 빼서 짊어지고 영산강을 건널 때 신 한 짝은 영산강의 요 쪽에다 벗어 놓고, 다른 한 짝은 건너편에 벗어놓았다. 짐대를 짊어지고 영산강을 훌쩍 뛰어 건넌 자취를 그렇게 딱 남겨 놓은 것이다.
영암의 학성군이 짐대를 도로 가져가려고 영산강에 와보니, 크나큰 신 한 짝은 이 쪽에 있는데, 다른 한 짝은 강 저 건너편에 있었다. 그래서 학성군은
'아하, 이거. 오장군이 여그서, 요 놈 짊어지고 이자 강을 건너 뛰어버렀구나. 나는 고 놈 짊어지고, 강을 일부러 건너왔는데, 걸어서 건너왔는데, 아, 보니까 신 한 짝이 여기에 있고, 저 건너에 한 짝이 있은께. 아, 무슨 뭐 짊어지고 걸어가다이, 강을 건너 뛰어부렀다 이것이여. 그러니 심이 얼마나 시겄는가?'라고 생각하고는
"아이구, 나, 진작 뽕해부러야제."
하였다. 그 뒤로는 영암서 짐대를 가져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주에 짐대가 서있게 된 것이다. 현재 나주병원 근처에 있는 짐대가 바로 이것이다.
(3)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나주 오장군
오장군은 열대여섯 살 먹어서 절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체구가 작아 중들이 매물리 보았다. 즉, 업수이 여겼다. 그리고 대접도 별로 안 해주었다. 그래서 오장군은
'저 놈들이, 중놈들이 저런다. 저 중놈들을 한번 깜짝 놀래게 해야 쓰겄다.'
하고 늘 생각하고 지냈다.
하루는 오장군이 새벽에 칙간을 갔다. 당시 칙간은 바깥에 뭐 크게 가린 것도 별로 없고, 한쪽편 구석에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오장군이 보니 앞에서 뭐 고양이 같은 것이 왔다갔다하며 아른아른 하였다. 그래서 용변을 보다가 그것을 잡아 옆구리에 끼고 앉았다가 볼 일을 다 끝낸 후 휙 뜅겨버렸더니 그것이 죽어버렸다. 그런 후 중들한테 가서
"아이, 나, 저그 변소에 가서이, 화장실에 안거서 안겄는디, 뭐 고양이가 와서 아른아른 하길래, 내가 이렇게 잡어가꼬 이렇게 여긋다 찌고 있다가, 띵게버린게 죽은 거 같았는디, 죽었는가 살았는가 가보라."
고 하였다. 중들이 가보니 그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호랑이였다. 그 조그만 사람이 잡은 것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다. 그 때서야 중들은 깜짝 놀라
"아, 이게 장사다. 천하장사 났구나."
하고 그 뒤로부터는 업수이 안 보고, 대접을 잘 해주었다.
나주 오장군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하지는 못했다. 장군이라면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승전을 해야 공이 나는 것인데, 나라에 전쟁이 없으면 공을 세울 기회가 없다.
(4) 나주 오장군의 기를 죽인 꼬마
오장군이 한참 젊었을 때는 기운이 발천되어 그냥 막 훌훌 돌아다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젊은 혈기에 막 때려죽이기도 했다. 오장군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도 하고 지냈다.
어느 날 오장군이 서울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중에서 한 열댓살 먹은 꼬마, 머슴애 하나를 만났다. 아이도 서울을 간다고 하여 둘이는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등에 짊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어 하지 않고 장군을 잘 따라다니면서, 백 리고 이백 리고 함께 가서 같이 자곤 하였다. 오장군이 걸음을 빨리 걸어도 아이는 잘 따라왔다. 따라오다가 중간에 떨어져버릴 수도 있으련만, 아이는 지친 기색도 없이 오장군을 잘 따라왔다. 마침내 오장군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이에게 물었다.
"너, 서울 간다는디 뭣허러 가냐? 서울 누구 찾아가냐?"
그랬더니 아이는
"서울 가서 우리 외숙 찾어가요."
하였다.
"너 외숙 뭣허냐?"
"우리 외숙이 말때깔 맨들어라우. 말때깔."
"그런디 말때깔 맨드는디 뭣허러 가냐?"
"말때깔 맨든디, 맨드시라고 쇠토막, 쇠토막 갖고 가요."
그러고보니 아이의 등에 짊어진 보따리에는 많은 쇠토막이 들어 있었다.
"그래야? 아 저, 벗어 봐라잉."
오장군이 들어보니 그 쇠토막은 오백 근, 한 오십 근이나 되었다. 아이는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도 그처럼 잘 따라온 것이다. 빈 보따리로 따라와도 못 따라올 판인데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도 그간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온 것이었다.
'아 이것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내가 기운이 발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댕인께, 사람을 해칠까 봐 나를 이렇게 주의시키고 경계시키니라고 허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오장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아이와 갈라서기로 했다.
"너허고 나허고 갈리자. 난 딴 데가 볼 일 있은께 너는 가고, 나는 요리 갈란다."
오장군은 아이와 갈라섰다. 아니, 신과 갈라섰다. 오장군은 이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본문 2:2]-----------------------------------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고대와 근대 우리네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일부나마 옛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 볼수 있는 인물이나 명당터 지역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나종삼옹의 구술과 이수자교수의 엮음으로 나주에 숨겨진 보물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졌던 민초들의 삶을 재 조명하는 기회와 나주에 대한 역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기록되지 않고 소리없이 사라져간 우리네 전통과 세시풍속 그리고 민초들의 희노애락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편집자주 -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