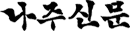공수의 예(拱手의 禮)
- 입력 2011.12.16 18:41
- 기자명 김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느 때처럼 낙타봉에서 장원봉 쪽으로 산등성이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가끔씩 마주치는 등산객을 만날 수 있었다.
팔각정에 미처 이르지 못 했을 즈음에 외모가 매우 부덕(婦德)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잠시발걸음을 멈추더니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저도 얼른 '예. 반갑습니다'하고 답례를 올렸다.
비좁은 등산길을 따라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등산객과 마주치게 되면 관례적으로 가볍게 인사말 한 마디만을 뒤로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중히 두 손을 모아 공수의 례를 깍듯이 건네는 부녀자의 고운 맵시를 뵙기란 여간 드문 일이다.
순간을 지나치는 상호간의 산행 길에서 법식 없는 상례지만 각별한 인사말과 부용(婦容)의 몸가짐이 그토록 아름다워 뒷날 남겨진 상념까지 쾌연(快然)하기 그지없다.
저의 옆집 아저씨는 얼굴상이 특이하게 서구 형으로 생겼다. 66년을 살아온 완전한 나주 토박이다. 몇 해 전 동네에서 타지방 관광지로 여행을 갔었다. 그 곳에 갔던 다른 팀의 나주 분들이 '닷째 아저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여기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닷째 아저씨 입장에선 낯모르는 분들이란다.
수인사란 인간관계에 있어 늘 갖춰야 할 예절이자 덕목이며 인륜도덕의 커다란 불문율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자동차문화에 젖어 초고속으로 바삐 돌아가야 살 수 있는 모양 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는 사람과 마주치더라도 바쁘다보니 인사 나눌 겨를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일은 십상이요, 자기와 당장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기본적인 목례(目禮)도 없이 살아가는 삭막한 삶이란 실로 허망뿐인 것이다.
공수례 아주머니의 자태로 부터 얻은 귀감적인 이야기처럼, 설령 낯모르는 사람과 인사를 한다고 해서 인품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거나 어리석고 못난이 취급을 받을 까닭도 없는 것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현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항상 어디서 누구와도 격의 없이 서로 인사 나누며생활하는 맑고 밝고 향기로운 명랑한 사회였으면 한다.
어느 때고 인사는 부족한 것 보다 지나친 편이 더 낫다는 톨스토이의 명언과 예의범절이란 법률보다도 더 위대한 것 이여서 선(善)에 통하는 지름길이다는 에머슨의 말이 자꾸만 가슴에 와 닿는다.
박천호 시민기자
김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