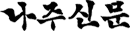4월의 추억
- 입력 2012.03.19 17:17
- 기자명 박순용 이샂ㅏㅇ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설희가 부른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다.
"연분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5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가사이다.
보릿고개 자락에서 배고픔을 달래며 많이 불렀던 노래 가락이기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으리라.
보릿고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고개였다.
보리개떡도 넉넉지 못해 과수원 언덕에서 띠 뿌리와 달구밥 그리고 쟁기질한 논바닥에서 옹구밥도 파서먹고 뫼운재 넘어 산골짜기 찾아가 칡뿌리도 캐먹고 진달래꽃도 따먹고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소나무 생키(송피)도 꺾어서 벗겨 먹고 소나 먹이고 퇴비에 쓰던 '풀 씨(자운영)'라는 풀을 논에 가서 뜯어다 삶아서 된장에 무쳐먹고 겨울 내내 아끼던 씨고구마를 퇴비 넣고 심어놓으면 잎순이 나기도 전에 몰래 파서 깎아 먹다가 부모님께 야단맞고 미꾸라지나 우렁 잡아다가 구워먹고 남의 선산에 시제 모시면 쫓아가 줄을 서서 떡 쪼가리나 얻어먹던 그 시절.
각설이 신세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
과연 요즘 세대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그때 어머님의 꼬부랑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살을 생각하 면 팔 남매를 이끌고 그 지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넘으시느라 생긴 주름이기에 저절로 눈물이 나곤 했다.
나는 그때 서럽내 서럽내해도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자주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참으로...
그 서럽고 어려웠던 시절이 왜 이렇게도 마음 시리도록 한없이 그리운 것일까?
비단 나만이 이처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왤까? 추억이나 향수때문일까?
아니면 북망산천에 먼저 가버린 민식이, 병섭이 움박우 그 소꼽동무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일까?
아니면 몸뚱아리는 다 늙고 덧없이 흘러 가버린 세월들이 못내 아쉬워서 일까?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세단을 타고 등짝을 뒤로 자때 밧때 재치고 다닌다마는 그래도 나는... 50년대 먼지 나는 울퉁불퉁한 신작로 길을 덜커덩 덜커덩 뒤뚱뒤뚱 거리며 흔들려가는 소구루마(달구지) 뒤쪽에 동무들과 앉아 넙떡지(엉덩이)가 멍이 들어도 그때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하다.
때문에 나는 지금도 내 마음의 그리움을 따라 고향산천을 찾아가지만 그때의 정취는 느낄 수가 없고 人生의 무상함이나 허무함 만을 느끼고 쓸쓸히 돌아온다. 그러면서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가고 싶고 그리립기만 한 것이 내 고향 산천이다.
작가 주) 내 고향의 이야기로 그 시절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박순용
(여수성심종합병원 재단회장. 영산중ㆍ고등학교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남문인협회 회원. 2010년 한국시 대상 수상.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박순용 이샂ㅏㅇ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