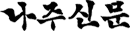실제로 영국하원 조사결과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4개월 동안 노동연계복지(workfare)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가운데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전환된 비율은 고작 3.6%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상한 수치(11.9%)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연계복지 제도는 직업훈련이 아니라 실업자들의 조건부 복지혜택을 족쇄로 하여 무급노동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장려세제 등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동연계복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말로 더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앤소니 기든스다. 「제 3의 길」을 통해 생산적 복지 개념을 제시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생산적 복지는 영국의 토니블레어가 내세운 노동연계복지정책이었다. 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경제적 파국에 직면했다. 이 무렵 영국의 최연소 총리가 된 블레어는 사회정의와 시장경제를 결합시킨 제3의 길을 표방해 영국의 국력을 강화시켰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경제와 복지의 동반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이어진다. 영국에서 시작된 제3의 길은 1970년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다.
영국은 1960년대 세계 제1의 복지국가였다. 그러나 1970년대 영국은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의 늪에 빠져버린다. 이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복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제1의 길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2의 길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자는 제3의 길이 급부상한 것이다. 제1의 길이 북유럽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방향이라면, 제2의 길은 시장에서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결국 제3의 길은 두 가지 길에 대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는 유행처럼 번져 1990년대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메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등불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은 왜 생산적 복지에 대해 비판적인지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복지의 핵심은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 자본 투자를 중시한다는데 있다. 예컨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직업 훈련과 교육 개혁 등의 적극적 복지 정책 시행으로 이들이 사회에 재편입되는 것을 돕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한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토니 블레어가 퇴장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 전 세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장 정직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기억한다. 생산적 복지가 내세운 빛과 그림자 모두가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진보주의의 혁신 모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된다. 그 기대 속에 복지는 좌우대립이나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수단이 아니란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생산적복지의 빛과 그림자
- 입력 2014.07.21 13:57
- 수정 2014.07.21 13:58
- 기자명 박상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하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