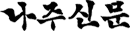어린 시절, 이웃마을에 유랑극단이 왔다는 이야기가 돌면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 몰래 창고에 있던 비닐포대를 훔쳐서 엿장수가 오면 바꿔먹던 시절이다.
동네마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던 바보아저씨나 머리에 꽃을 꼽고 다니는 여자 지체장애인들이 꼭 한명씩은 있었던 시절이다.
유랑극단이 오는 날이면 동네 형님들은 너나없이 불량배 코스프레로 짝대기 하나씩을 들고 다니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며 거들먹거리고 다녔다.
그래도 뭐가 좋은지 우리들은 으슥하니 날이 어두워지면 밤마실에 나섰다.
유랑극단이 진을 치고 있는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하얗게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알록달록 예쁜 한복에 허리를 잘록하게 묶은 누나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더 보려고 왔던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하던 시절이다.
그러다가 친구 중에 한명이 유랑극단의 공연장 천막의 개구멍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날은 요즘말로 계 탄 날이다.
천막 안으로 운 좋게 들어간 친구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딱 걸려서 꿀밤하나씩 얻어맞고 쫒겨났다.
그래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무사히 들어간 친구들의 후일담을 듣기 위해 주변 언덕을 뱅뱅 돌며 공연이 끝날 때 까지 어슬렁 거렸다.
유랑극단 천막 안에서는 변사들의 흥을 돋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간간히 들려오는 관중들의 환호성에 발을 동동 굴렸다.
그렇게 야속한 시간은 흐르고.......
천막 주변을 지키던 아저씨들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 즈음 또 작전을 짠다.
공연 관계자들이 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으레 공연장 천막의 개구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도록 배려해줬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었기에, 가슴졸이며 우리 딴엔 주도면밀하게 공연장 진입을 시도했었다.
그리고 어렵게 공연장 진입에 성공해 키가 큰 어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봤던 유랑극단.
흰 분칠에 빨간 코로 눈은 울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동동 구루미 아저씨가 발로 등에 멘 북을 치며 손으로는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입으로는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에 절로 가슴이 뛰었었다.
다 떨어진 옷에 평생 한 번도 안 씻었을 것 같은 거지 아저씨가 깡통하나 차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엄청나게 야한 농을 치는데도 다들 뭐가 그리 좋은지 왁자지껄 웃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겨우 들어왔는데 사회자가 다음에 또 찾아뵙겠다고 막을 내리는데 얼마나 서운했던가?
그렇게 유년시절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유랑극단을 나주신문사가 추진하고 있다.
언제 맥이 끊어질지 아니면 이미 맥이 끊어졌는지도 모를 유랑극단을 나주신문이 어렵게 조합해서 시민들에게 유료로 선보인다.
뽀빠이 이상용과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자니 리, 장미화 등의 가수들.
그리고 서커스단과 러시아 무용수, 여기에 어릿광대까지.....
요즘 세대들에게는 낯설지만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의 책갈피 한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을 그 유랑극단이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70년대 추억의 장으로 초대하는 자리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잊혀 져 가는 옛 추억을 한번쯤 경험해보시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