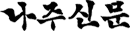자뻑! 우리가 흔히 고스톱을 치면서 쓰는 용어지만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자랑질을 할 때 이를 빚대어 사용하는 은어다.
누군가가 자신을 자랑칠 때 “자뻑하고 있네”라며 놀려대는 말이란 뜻이다.
딱히 악의적인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표현도 아닌 것은 확실하다. 아마 “그래 너 잘났다” 정도의 함의는 있으리라.
이렇게 사용된 자뻑이라는 일이 필자에게도 일어났다.
딱 30년만에 기적같은 일이....
1985년은 대한민국 대학가에 학내민주화 바람이 최정점에 있었던 시기다.
교내에 일상적으로 상주했던 전투경찰이 모두 학교밖으로 밀려났고, 모든 대학들이 민주적인 총학생회를 구성해 운동권의 구심점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는 5월이라는 상징적인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민주화의 열망이 높았던 것 같다.
그 시기에 전남대에 입학한 필자는 당연한 수순처럼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했고, 이념서적을 탐독하고 집회에서는 화염병을 들었다.
지금처럼 취직하기 위해 스팩을 쌓는 대학이 아니라 민주화와 민중의 삶에 천착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게다가 운동권내에서 노선투쟁이 치열하게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NL계열과 PD계열이 각 대학마다 노선을 달리하며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벌였었다.
동지가는 그때 만들어졌다.
고등학교때부터 기타를 치던 필자로서는 시쳇말로 ‘어쩌다가 만든 노래’가 바로 동지가였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리듬과 음율이 딱딱하고 투박한 거친 노래였다.
함께 활동했던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철야농성장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후 전국대학으로 전파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노동현장까지 전파되어 전국적인 투쟁가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슬퍼런 군부독재정권 시절이라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명을 내걸지 않았고, 동지가는 전남대생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나돌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지가는 각종 시위현장이나 파업현장에서 불리워지는 대표적인 투쟁가로 운동가요로 자리잡았고, 필자는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흔한말로 저작권자로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운동가요 서적에도 노래악보는 빠지지 않고 게재됐지만 작자는 미상이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 처음으로 동지가 원작자로서 필자가 인정을 받았다.
5·18기념재단에서 80년대와 90년대에 불리워졌던 운동권 노래를 재조명하면서 동지가의 원작자를 발굴했기 때문이다.
자료집에 남기기 위한 카메라 촬영도 해보고, 당시에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구술인터뷰도 해보고, 소액이지만 저작료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아보는 영광을 30년만에 경험했다.
게다가 유명 드라마(응답하라 1988)에까지 동지가라는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짜릿한 전율까지 느꼈다.
살다보니 이러한 일도 있다.
자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