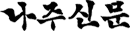계곡을 휘감고 내려오는 가을 물을 거슬러 한적한 도로를 따라 가을의 흔적들 쫒아 오르다보면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영광에 불갑사를 창건한 후 384년(침류왕1년)에 세웠다는 천년고찰 불회사가 연꽃 속에 자리 잡고 꽃불을 밝히고 있다.
부처가 모여드는 불회사 길 단풍이 화려하다. 전나무, 삼나무, 비자나무, 붉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힘주어 뻗어 올린 마석 줄기들과 엉클어져 있어 밟고 서 있는 것조차도 화려하다.
텅 빈 길이 성글게 내려 앉아 있다. 단풍이 진 자리에는 화려함의 흔적만을 남긴 채 계절을 서둘러 보내고 있는 것일까. 400여년 전 사찰의 사악한 부정을 막기 위해 세워진 석장승(중요민속자료 제11호)을 미소 띤 얼굴로 마주하고 법당으로 몸을 돌리자 단풍을 헤집고 들려오는 염불소리에 몸을 추스른다.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삶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나를 돌아보고 있다. 아직도 한줌도 되지 않는 가증스러운 영화로움을 꿈꾸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는 삶의 집착이 아닌 관습이 되어버린 것을 붙들고 법당에 들어 와 치열하게 벗어내고자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이다.
도량道場안에는 붉게 익은 홍시가 여름 해를 토해 내 놓았고, 산기슭에 우뚝 선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이고, 대웅전 뒤뜰에 푸르른 비자림과 동백은 노쇠한 불회사의 법당을 지키고 있다.
휘돌아 가는 산물을 따라 편한 마음으로 내려오니, 늙은 어미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는 젊은 부인을 뒤따르며 삶을 돌아본다.
어느 해, 저 늙은 어미도 단풍이 화려한 날, 아장아장 걷는 딸의 발걸음에 사랑을 베풀며 찾아와 부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였으리라, 그리하여 오늘, 그 딸은 늙은 어미를 붙들고 찾아와 오래 오래 강녕하게 살아줄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리라. 만추의 계절 앞에서 시려오는 마음에 슬그머니 앞질러 가지 않을 수 없다.
다람쥐 한 마리가 머뭇거리며 산을 오르는 계곡너머에는 한 무리 사람들이 눌러대는 셔터소리가 요란하다. 늦가을을 붙들고자 하는 사진작가들의 예리한 눈과 피사체를 향해 두리번거리는 광 렌즈의 우람함에 쪼개진 가을햇살이 멈칫거린다.
짙어진 가을을 뒤로하고 가만히 산길을 오른다.
가파른 산길에는 운무가 노란은행잎을 누르고 있다. 가을 짙은 산길이 조화롭다. 목덜미로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거칠어진 산길을 말해준다. 하늘을 치솟는 산새들 소리가 고요를 깨우고 지나가는 낯설음의 마중이 소란스럽다.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을 보듬고 앉아 흐르는 구름떼를 쫒고 있을 즈음 무리지어 내려오는 등산객들의 얼굴에 핀 붉은 단풍잎 같은 미소를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저토록 해맑은 미소가 번지게 할까? 덕룡산 연화대를 타고 오르며 집착하나를 털어냈을 뿐인데 사람들의 미소가 아름답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집착 하나를 벗고 편한 마음으로 덕룡산을 오르면 해맑은 미소를 볼 수 있는 걸까?
늦가을 햇빛이 물 푸른 나주호를 품고 있다. 하늘에 맞닿은 하늘 호수처럼 산 중턱에 걸려 가깝고 푸르다. 금방이라도 풋풋한 물 냄새가 풍겨 올 것 같은 나주호를 뒤로하고 곱게 펴진 산길을 오르자, 1403년(태종3년) 나주출신 원진국사가 불회사 대웅전 중건 상량식 때 산에 걸린 해를 붙잡아 두고 예정된 날짜에 상량식을 마쳤다고 하여 원진스님이 기도했던 자리에 지은 일봉암이 처마 끝에 묶인 풍경하나를 걸고 늦가을 햇살에 꾸벅거리고 있다.
산을 씻고 흐르는 바람조차도 봉해버린 암자, 구름마저 가두어 두고 싶은 걸까? 암자에 묶여진 풍경하나가 산을 깨운다.
“땡그랑 ∼ 땡그랑”
굳게 닫힌 일봉암 일주문. 무문사관에 든 수행자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무거운 자물통이 쇠줄로 폐쇄 해버린 푯말이 서늘하다. 그림자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암자는 서걱거리는 산죽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울 뿐, 깊은 적요에 들어 산 아래 사람들을 조용히 거부하고 있다.
일주문 주변으로 철조망을 둘러친 것을 보니 죽음을 불사하고 일봉암 무문관에 들어 수행하는 수행스님들을 방해 할 수 없어 문밖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철지난 장미 한 송이가 철조망위에 붉게 피어 가부좌를 틀고 화두를 찾고 있는 수행자의 고단함을 위로라도 하려는 걸까?
곱디고운 수행자의 흔적을 찾았기에 그나마 위안이다. 단풍잎이 곱게 물든 일봉암으로 늦가을 바람이 지나간다. 일봉암 처마에 봉해진 풍경이 덕룡산을 다시 한 번 깨운다.
“땡그랑∼ ∼ 땡그랑”
덕룡산 꽃불 일봉암(日封庵)
- 입력 2016.12.07 10:00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신문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