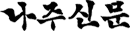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오가는 손님들이 세월이었네"
단골들과 함께 주름살 는 이발사 이연우씨
- 입력 2009.11.24 10:27
- 기자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기에 수 십년 자리를 지킨 백발의 이발사를 본다면 아마도 우리 어릴 적 저분이 내 머리를 빡빡 밀었겠구나라는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 남자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은 깍까머리(빡빡머리)였다.
유년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간 그곳엔 항상 근엄한 듯 하고 친근한 듯도 한 아저씨가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그 고집 세고 빳빳한 우리 아버지들도 그가 지시하는 말에는 거부하지 않는다.
"앉으시지요. 고개를 살짝 돌리시지요. 숙이시지요. 머리 깜게 이리 오시지요" 등 마치 많은 권능을 지닌 듯한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하고 다정했던 그 아저씨도 어느덧 주름이 늘어 흰머리 단정하게 빗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와 살아왔던 그 많은 손님들도 옛 이야기처럼 이발소의 일부가 돼버렸다.
중앙이발관 이연우(73세, 1933년생)씨.
고향이 무주군 안성면인 그는 1960년대 나주로 이주했다. 1961년 지금은 어진이마트 (구 신협 4거리)에서 이발소의 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직원이 천 여명인 호남비료(지금의 LG공장)가 있어 손님들이 많아 호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쇠퇴기를 겪었다.
"옛날에는 많은 새신랑들이 부푼 첫날밤의 꿈을 안고 이발의자에 앉아 머리를 다듬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면서 식장으로 향했다" 이들이 식구들이 불면 가족이 함께 와서 머리를 자르고 갔다고 한다. 와봤던 옛 추억 때문에 간간히 면 지역에서나 광주에서도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수십년 단골들도 그를 찾는다.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기만 한편으론 먼저 가버린 가족 또는 친구 같은 단골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뭔가 허전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이발가운을 걸치고 오래된 손님들을 맞는다. 과거엔 생계였을 뿐이지만 지금 그의 터전은 그가 살아온 전부인 것이다. "아직도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그.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기울이며 반갑게 주름살 넉넉한 옛 손님을 맞는다.
그는 가위를 잡고 누군가의 머리를 매만지고 시원스럽게 면도질하고 머리를 깜겨줄 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것이리라. 늙었어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 용돈을 타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하니 건강해서 그의 황혼은 따뜻하다.
오늘도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손님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시원한 손놀림으로 50여년 한결 같이 가꾸고 연마한 섬세한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그의 이발소엔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이 남겨져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