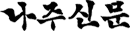땅
- 입력 2009.12.08 10:21
- 기자명 박천호 시민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은 만물을 생성발육 시키는 모태(母胎)같은 성질의 것이면서 그 위에 온갖 현상을 발현하는 토대라는 거대한 존재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땅은 보통 말하는 소유개념인 '네땅 내땅'하는 지경(地境)의 관점으로 이야기 해 보기로 하자.
신개발지역 같은 곳을 지나다 보면 땅, 땅, 땅하는 입간판의 즐비함 속에 사고파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
큰 부자는 하늘에 있고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 있다.(大富由天, 小富由勤) "아니다. 큰 부자는 땅에 있다"하고 무소처럼 저돌적으로 마구 달려들고 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본위가 그 어느 다른 사물보다 우선시되는 풍조의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며 밭아 들이겠다.
그래도 나는 땅을 가지지 못했다. 또 관심도 없다.
땅에서 보는 주객 관계라면 건너편에 보이는 피사체 모양의 객체인 나의 처지가 무척이나 왜소한 체격에 초라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비추어 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굳이 누구를 탓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물질과 정신이 서로 교차하여 상존하는 가치관의 의식구조 속에 본디 타고난 성정(性情)이 정신위주의 이념적 인생관을 중시여기고 여태껏 그 쪽으로 만을 우직스럽게 찾으며 흉내 내왔기에 물질에는 색맹이 되는 셈이다. 가난은 결코 죄악이 아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조끔 불편할 따름이다.
"그래 그것이 내가 살라온 삶의 방식이었지!" 라고 노래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my way)를 가다보니 어느덧 이순(耳順)의 역참(驛站)을 막 지나고 있는 것이다.
무사는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정복시키려 하고
정치가는 웅변을 통해 통치자가 되고자하,
부호는 땅과 돈으로 인간의 허약함을 지배하려 하지만
문필가는 붓을 휘둘러 인간의 정신을 굴복시키려 한다.
<노자와 21세기 / 도올>
이 글의 요지는 땅하면 하늘과 대칭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넓은 땅이 아닌 조그마한 땅 이야기이다.
저희 집 대문 앞에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했었는데 아랫집 담 넘어 서너 평 남짓한 땅을 이웃 간에 서로 타협이 되어 넓혀지게 되었다.
이젠 그 공간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백만금에 버금가는 유용(有用)한 땅인 것이며 날이 갈수록 지리적(地利的) 이윤증식은 계속 될 것이다.
한 톨의 작은 땅일지라도 금싸라기 땅으로 알고 주신 분의 고마운 뜻을 항상 생각하며 자유자재로 드나들 것이다.
박천호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