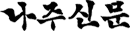이른 아침부터 북적북적한 영산포 터미널.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여정에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매표소 여직원.
이창동에 거주하는 박정선(39)씨다.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5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이 곳 터미널 매표소에 격일제로 근무 하고 있다.
조그마한 창구사이로 쉴 새 없이 돈과 버스표가 오고간다. 길게 늘어선 줄, 여기저기서 표를 달라며 외쳐댄다. 말 그대로 숨 돌릴 틈 없이 홀로 바쁘다.

매표소 바로 옆에는 승차권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원이 꺼져있다.
“보통 연로하신 분들은 판매기 사용법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버튼 글씨가 작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거스름돈이 나왔는데도 그냥 가시거나, 시간이 지체 되서 기계가 오작동되는 경우도 많아요. 간혹 판매기가 취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점심시간이나,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매표를 합니다. 도착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다음 차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좀 바쁘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구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터미널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노선과 시간표가 컴퓨터처럼 입력 되있는 듯 하다.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매표소 근무도 벌써 5년 째, 처음엔 지속적으로 표를 뽑는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가 금방 가는 날도 있었다고. 가끔 처음 듣는 동네 이름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관련 책도 찾아보며 이러한 점들을 스스로 배워나갔다고 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성을 내며 깨질 듯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 누군가 창구 구멍으로 팔을 끄집어 자신의 팔에 상처를 입었던 아찔했던 순간들, 1~2분 차이로 차를 놓쳐서 ‘왜 도착시간에 차가 오지 않냐’며 무작정 화를 내며 따지는 사람, 적선하듯이 돈을 던지고 욕 섞인 말로 ‘빨리 빨리’를 외치는 사람 등 창구를 통해 다양한 군상을 만난다.
“사람들을 상대해야하는 서비스업이 다 그렇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디 쉬운 일들이 있나요. 그냥 세상인심이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구나 하는 거지요.” 라고 지그시 웃는다.
하루는 탑승시간에 쫓겨 다급한 어느 손님에게 신속히 대처해 도움을 줬더니,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찾아와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럴 때란다.
특별한 일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매표소 근무를 계속 하겠다는 정선씨는 끝으로 이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소소한 바람을 전했다.
"가시고자 하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광주가는 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산포 터미널에는 광주로 가는 버스가 다양하거든요. 각각의 노선도 다르구요.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뒤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으실 때가 많아요. 또 표를 잘못 끊어서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행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조그마한 창구를 통해 세상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