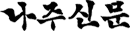나주 축제의 맏이 격인 홍어축제를 필두로 영산강 유채꽃 축제, 각종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올해는 또, 다시면 복암리 고분 일대서 보리축제가 새로이 열렸고, 10만 인구 회복을 축하하는 어울마당이 펼쳐졌다.
이뿐인가 다가올 가을에는 억새풀의 낭만을, 작년 첫 개최에도 호평을 이끌어낸 마한역사문화축제까지,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를 의미하는 앞서 향연이라는 단어에 걸 맞는 이른바 ‘축제 부자’ 나주시다.
이처럼 축제에 있어 양적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나주시지만, 반대로 질적 성장은 좀처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차린 것은 많은데 딱히 자랑할 만 한 것이 없다. 실속이 없다는 것, 바로 대표축제의 부재다.
양적성장의 배경에는 대표축제 발굴을 위한 나주시의 끊임없는 시도에 있었고, 그 이면에 이름도 채 기억 못할 정도로 단명하고 만 온갖 축제들이 캐비넷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열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름 장수 반열에 오른 홍어축제 존재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이 또한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축제의 평가 기준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얼마나 많은 관중을 동원했는가에 따른 흥행적 측면과 축제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문화적 또는 정서적 교감을 얼마나 이끌어 냈는가, 지역 축제의 본질에 가까운 화합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홍어축제는 흥행 측면에서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악천 후가 내리던 둘째 날을 제외하곤 첫 날, 그리고 주말을 낀 마지막 날에는 주차장에는 만차 표시판이 세워졌다.
유채꽃으로 장식된 영산강변 일대는 가족단위 상춘객들로 북적였고, 삼합과 막걸리는 불티나게 팔렸다.
그렇다면 후자에 속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화합적 측면의 체감정도는 어땠을까? 유감스럽지만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다.
축제의 진정한 주체가 됐어야 할 시민들은 장사꾼들에게 둘러싸인 소비자 들러리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다. 천차만별의 음식 가격에 시민들은 혀를 차기 일쑤였고, 홍어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변변한 시식코너 하나 찾기 어려웠다.
‘
축제=먹자판’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홍어 축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농장’이 되어 그들만의 축제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친 일상 속에서 모처럼 축제를 찾아 문화적·정서적 욕구가 얼마나 해소됐는지는 일일이 측량할 순 없겠지만,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형화된 축제 흐름은 지루함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홍어를 매개로 한 나주 시민들의 화합은 과연 가능했을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먹자판 축제가 자칫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비춰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또한 축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축제의 본질적 측면 즉, 정체성을 놓고 볼 때, 그것은 후진적 축제 문화에 가깝다.
축제는 무엇을 매개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자의 질적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축제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할 점은 시민 다수가 주체가 되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화합이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판부터 벌리고 보는 양적성장에 도취되어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냉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자칭 ‘축제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축제보다는 시민 다수가 만들어나가는 축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다.
대표축제 발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