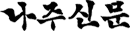학교를 갔다오면 일과 중 하나는 ‘깔(풀)’을 베로 가는 것이었다. 기껏 송아지 한 마리와 돼지 두어 마리 정도였지만 소는 우리집의 든든한 밑천이었다.
망태기를 짊어지고 성적굴 근처 오리나무 그늘진 곳에 보드라운 풀을 베어 망태를 채운 뒤, 근처에서 새둥지를 뒤지거나 하늘소 등을 잡거나 하다가 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대부분의 이웃들도 소를 키우는지라 ‘깔’을 뜯을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 논·밭두렁의 풀은 기본적으로 논밭 소유자의 것이었다. 가끔 금기를 어기는 이가 있으면 어김없이 주인집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모든것이 귀한 세상이었다.
지금에야 애물단지로 전락한 소·돼지똥도 텃밭의 소중한 거름이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는 영산포장으로 가서 소를 팔고 다시 송아지를 사왔다. 건강한 이웃들은 황소로 키워 쟁기질을 했지만, 가장의 몸이 불편했던 우리집은 송아지로 만족해야만 했다.
뿌사리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 이웃 삼촌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소는 때로 거칠고 외양간을 뛰쳐나와 논밭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런 소였지만 봄철 쟁기철에는 소가 갑(甲)이었다. 힘이 딸리면 영산포장에서 사온 낚지도 소의 몫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녀의 학자금의 원천이 되었다. 소를 키우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본연의 임무를 소흘이 하는 상황을 이르러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질책을 하게 된다.

나주시의 21년말 통계를 보면 한·육우 농가호수는 1,573호이고 57,462마리라고 한다. 22년말 전남도의 통계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소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다.
최근 5년간 소득 1억원 이상 농가수가 꾸준히 늘어 역대 최다인 6천23호를 기록했다. 이중 축산농가가 2천292호로 38%를 차지했고, 식량작물농가 2천52호(34%), 채소농가 893호(15%), 과수농가 254호(4%) 등 순이었다. 시군별 축산농가는 해남군이 720호(12%)로 가장 많았고, 고흥군 646호(11%), 강진군 577호(10%), 영광군 481호(8%) 순이라고 한다.
전 세계 소 사육두수는 약 10억 마리로 인구 밀도 기준 가장 많은 소를 사육하는 나라는 우루과이로 인구 수 346만명에 1천195만두의 소를 사육하여 1인당 3.45두의 소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377만두를 사육하여 인구 1인당 0.07두를, 와규로 유명한 일본도 392만두의 소를 사육하여 1인당 0.03두 정도다. 소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인도가 약 3억마리 중국은 약 1억마리 정도라고 한다.
소깔을 베러가는 은밀하고도 즐거운 노동은 고등학교 진학으로 끝장이 났다. 누나들은 시집을 갔고 남자 형제들은 도시로 유학을 떠났다. 아버지도 강제징용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논일을 돌봐야 했다. 더 이상 소를 키울 사람이나 없어진 것이다.
소가 사라진 작은 외양간은 헛간으로 퇴락하고 가마니, 농기구, 고추대 등 땔감으로 채워졌다. 소가 없는 집안은 점점 살림이 줄고 허전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대처로 마을 젊은이들이 떠나고 농사는 경운기의 등장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격동의 70년대가 지나고 88년 올림픽과 민주화 운동에 이어 90년~2천년대 세계화의 물결은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부상하였다. 해방이후 70여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중화학공업이라는 소를 키우는데 동원된 결과였다.

1958년부터 1963년 테어난 세대를 베이버 부머라고 한다. 배고품에서 벗어나고 최초로 자가용을 소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제조업중심 수출대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세상은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로 변화를 거듭한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IMF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성장신화의 버블은 소위 MZ세대들에게 무거운 짊을 안기고 말았다. 부모세대들이 겪었던 어려움 대신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에게 `소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다. 최근 외국의 한 젊은이가 실토한 것처럼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한탄은 꼰대와 라떼라는 이름으로 폄하되어 버린지 오래다.
제조강국이 남긴 유산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에 축제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축제는 시도 때도 없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로 축척한 재정이 절정을 이룬 200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의 정권교체 속에서도 광장은 축제의 물결로 넘실거린다.
이미 빈부격차가 더 이상 통제불능한 상황속에서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펜데믹이 닥쳐다.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들은 금고에 넘쳐나는 재정흑자를 재난지원금으로 대표되는 표(票)플리즘 재원으로 소진하고야 말았다.
곳간에 인심 난다고 했던가. 곳간의 인심이 사라지고 난 이후 여지없이 다툼이 일고 다툼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1,2차 세계대전은 보호무역으로 촉발되었고 GATT, WTO 등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었다. 아무도 미중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예측하지 않았다.
다시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고통을 거부하는 축제의 물결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가운데서도 기획된 축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소는 누가 키울지 걱정이다.
10.29일은 국적도 없는 축제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할로윈 참사 1주년이다. 축제는 노동의 고달품을 달래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축제가 죽음이 되고 노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강요된 축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다. 소음이고 고통이다.
축제가 열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한끼 식사를 걱정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이미 오버투어리즘이나 대규모 먹거리 기획축제는 그린투어리즘과 공정여행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산천어축제나 빙어축제는 생명경시 축제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다행이 나주는 그동안의 과잉 축제를 통폐합하여 ‘영산강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으로 품격을 높이는 축제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형태의 축제에 대해 일부 비판도 있지만 변화와 혁신은 늘 필요하고 발전의 동력이 된다. 불편하지만 가야할 길을 탐색하는 도전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근면 성실한 노력이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약할 수 없다. 과잉 축제가 삶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저해할 수있다. 소를 키우는 것이말로 삶을 살아내는 기본이며 내면의 축제다.